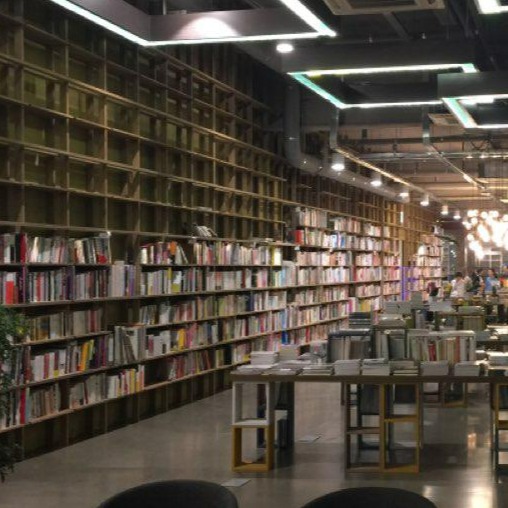우리는 왜 설탕에 끌릴까?
우리는 왜 설탕에 끌릴까?
크림이 듬뿍 올려진 달짝한 디저트는 보기만 해도 즐겁다. 모든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다 맛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단맛에 끌리는 것일까? 오래전 설탕은 슈퍼푸드였다. 중세 유럽에서 설탕은 만병통치약과 같았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설탕은 음식이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금식기간에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였다. 단맛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도당, 즉 단맛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울 수 있었다. 결국 진화적으로 포도당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5g 정도다. 특히 청소년층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 짐작하다시피 청량음료 때문이다. 성인들은 커피를 통한 당 섭취가 많다...
 종자와 몬산토
종자와 몬산토
우리 조상들은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둔 다음 좋은 종자를 골라 다음 해 농사에 사용했다. 파종한 후에 수확하고, 저장하고 다시 파종하는 이 과정은 오랫동안 내려온 자연의 섭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1. F1종자 종자는 수확한 농작물에서 씨앗을 받아 파종하면 다음 세대에 같은 작물이 자라나는 씨앗을 고정종자라고 하고, 새로운 씨앗을 구입해야 한다면 F1종자라고 한다. F1이라는 건 멘델의 유전법칙에서 봤던 용어인데, 잡종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F는 '자식'이나 '자손'을 나타내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한다. 이 F1종자는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우수한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씨앗을 받는다고 해도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파종할 수가 없다. 시중에서 파는 작물..
 재미있는 꽃 이야기
재미있는 꽃 이야기
한때 내가 좋아했던 꽃은 목련이다. 잎 없이 뽀얗게 피어났다가 어느새 처연하게 뚝뚝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꽃은 다 다르다. 또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선호되는 꽃도 다르다. 꽃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모아보았다. 1. 나라별로 선호되는 꽃 미국에서 선호도 1위의 꽃은 단연 장미다. 뒤를 이어, 카네이션, 국화, 알스트로에메리아, 튤립, 데이지, 백합, 글라디올러스, 아이리스, 안개꽃 순이다. 낯선 이름의 알스트로에메리아는 남아메리카 야생화인데, 꽃병 속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한다. 외모로는 빠지지 않는 튤립이 5위인 것도 생명력이 짧기 때문일지 모른다. 영국도 비슷한 순서다. 일본은 튤립, 장미, 라벤더 순이다. 2.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어쨌거나 꽃..
 스페인독감
스페인독감
1900년대 초에 등장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스페인독감이 코로나시대를 맞아 여기저기서 소환되고 있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시작되어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독감이다. 중세의 페스트보다 사망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부디 코로나19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길. 스페인독감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었으니 큰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급속하게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전이었으므로 스페인독감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2005년 미국에서 알래스카에 묻혀 있던 여성의 폐조직에서 스페인독감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A형이라는 것..